일요일인 3일 오후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무너진 서울 용산 재개발 5구역 4층 건물은 평일엔 1, 2층 음식점이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어서 자칫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입주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치긴 했으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정확한 원인은 합동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의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우선 용산구청의 책임이 크다. 인근 용산 센트럴파크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여파로 지난해부터 건물에 금이 가는가 하면 지난달엔 벽이 불룩 튀어나와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이상 조짐을 구청에 신고했는데도 묵살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용산구 쪽은 신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과 건물주를 만나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다지만 건물주는 “공무원이 다녀간 것도 몰랐다”고 말한다. 구청은 사고 뒤에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면 안전도 조합 책임’이라는 태도라고 하니,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 구조진단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5구역 내 11개 건물의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3개 건물의 입주를 보류시킨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철거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서울에만 309곳이나 된다고 한다. 비슷한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다. 서울시는 10년이 넘은 182곳부터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적절한 조처이나, 근본적으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지정 뒤 사업 추진 일정이 늘어져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구청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터파기 공사 전에 주변 건물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고공화국’의 오명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행정당국은 이번 사고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

![[포토]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선생 1주기 추도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8/53_17449546297399_20250418501868.webp)




![[사설] ‘헌법 존중하라’는 퇴임 재판관 당부 새겨들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8/53_17449688795351_20250418502743.webp)

![[영상] 건대 양꼬치 거리 한복판서 혐중 시위한 윤석열 지지 극우 청년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8/53_17449614513883_2025041850245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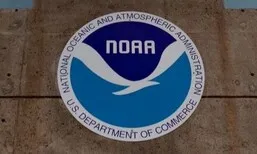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1억원 돈거래 정황…“김영선 선거비용 5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5/53_17446987298565_20250415502731.webp)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윤석열 늪에 빠진 국힘, 손절 시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0418/20250418502139.webp)

![<font color="#00b8b1">[영상]</font> 윤 지지 극우 무리, 건대 양꼬치 거리 한복판서 혐중 행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8/53_17449614513883_20250418502457.webp)

![<font color="#00b8b1">[포토] </font>국회에 온 2명의 EBS 사장?…“누가 사장이냐” 묻자 “접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8/53_17449665234829_20250418502693.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