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형성된 난기류가 심상치 않다. 회장 인선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 5명 안팎의 후보군을 정하기로 예고한 20일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권력의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대통령이 기업들(KT·포스코)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조점은 달라도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이 묻어난다. “선임 과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권칠승 민주당 의원)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민기업’ 포스코가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승계 카운슬에 속한 사외이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목이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얽힌 잡음은 지난 4월 후보군을 뽑기 위한 승계 카운슬을 구성할 때부터 싹을 보였다. 사외이사 7명 중 5명과, 이미 퇴임 의사를 밝힌 권오준 회장으로 승계 카운슬을 구성한 것이다. 회사 규정(승계 카운슬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회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는 해도 물러나기로 한 회장이 미련을 못 버렸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 더욱이 사외이사들 상당수가 권 회장의 영향권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였다. 권 회장은 2차 회의 때부터 카운슬에서 빠졌다.
카운슬의 구성 못지않게 운영 방식도 비판을 받을 만했다. 승계 카운슬은 이달 14일 7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하는 동안 인선 작업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사 안팎에서 후보군에 대한 소문이 난무했던 배경이다. 실세 개입설과 함께, 특정 내부 세력의 포스코 사유화 시비가 불거졌다. 이전 경영진과 무관치 않은 사외이사들의 자격 시비도 같은 맥락이었다.
카운슬에 포함된 사외이사들은 차기 회장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최종 인선 결과로 평가받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후보군 중 적임자가 없으면 원점으로 되돌리고, 후보군의 면면을 공개하는 식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투명성을 높이는 게 잡음과 난기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공개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정치권의 외압도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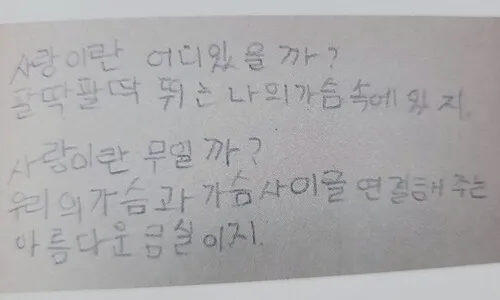


![[속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국힘 2차 경선 진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53_17453155058534_6217453154869974.webp)




![[사설] ‘2+2 관세 협상’, 미국 속도전에 끌려가선 안 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53_17453139020884_20250422503373.webp)
![트럼프의 약점 [유레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17453106156552_20250422503251.webp)










![[단독] “전광삼 수석, 명태균에 ‘오세훈 공표 여론조사’ 언론사 연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53_17453132036042_20250422503407.webp)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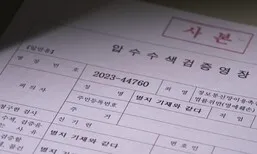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사람에 충성 않는다” 난장판 된 내란재판 정화한 참군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025604065_20250422502384.webp)
![<font color="#FF4000">[속보] </font>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국힘 2차 경선 진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155058534_6217453154869974.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출국한 ‘홍준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측근 “검·경 연락 없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123741052_20250422503352.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전광삼 수석, 명태균에 ‘오세훈 공표 여론조사’ 언론사 연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132036042_2025042250340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