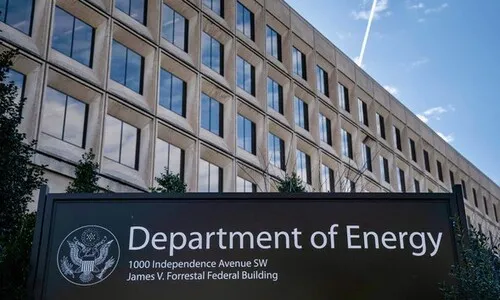청와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언론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자칫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격차 해소’라는 핵심 목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의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로 데이터)를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이 면밀한 분석을 한 결과”라며 “소득 하위 10%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8.9%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보다 낮았을 뿐, 나머지 90%는 모두 올해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 다시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은 빠진 통계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말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고 단정짓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다. 하지만 정책 수립과 집행의 책임을 진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김 대변인 말처럼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아직까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내년과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각각 9만6천명과 14만4천명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속도 조절론’을 제안한 것이다.
모든 정책엔 기대했던 효과 외에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100% 완벽한 정책이란 없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옳은 방향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긴요하다. 저소득층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제(EITC)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등 최저임금을 넘어 정책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 관련 기사 : “최저임금 내년 큰 폭 인상 땐 득보다 실” KDI 보고서 논란
▶ 관련 기사 : “임금노동자만 본다?” 청와대의 반쪽짜리 최저임금 분석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말든…[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0415/20250415503852.webp)


![[사설] ‘파면’된 정권의 ‘내란 알박기 인사’, 상식도 염치도 없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5/53_17447087980656_20250415503663.webp)

![[사설] 빨라진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내려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5/53_17447080113083_20250415503650.webp)
![[단독] 중국 ESS 배터리에 미 관세 156%…K-배터리엔 기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5/53_17447074966673_20250415503619.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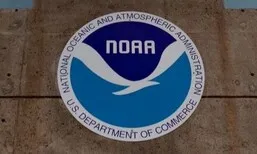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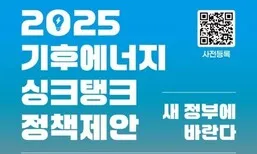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1억원 돈거래 정황…“김영선 선거비용 5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5/53_17446987298565_2025041550273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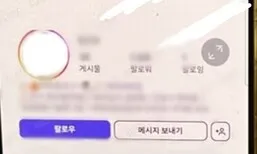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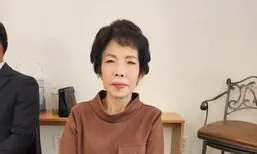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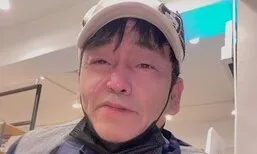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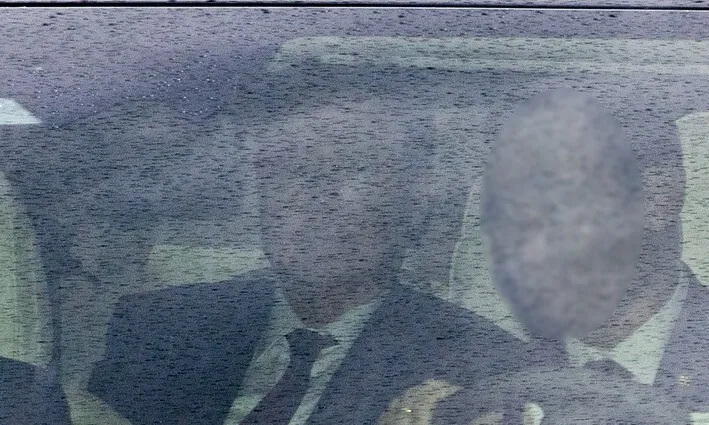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윤석열의 시뻘건 거짓말 쇼와 국힘의 허무한 ‘빅 텐트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5/53_17446978316307_20250415502600.webp)

![<font color="#FF4000">[속보] </font>김성훈 경호차장 “4월 말 사퇴”…초유의 연판장에 백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5/53_17447043247875_20250415503410.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