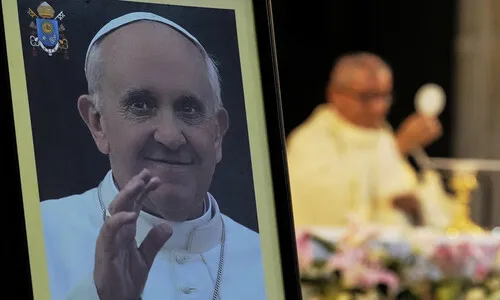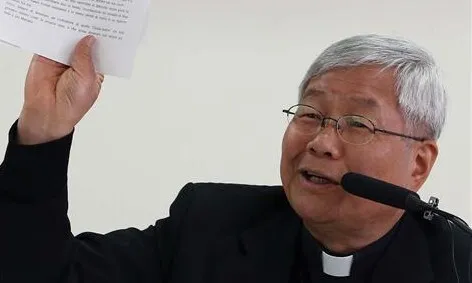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고용주의 강요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고용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휴가도 허락을 받아 사용하지만 회사가 요구한 고용 조건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유령 노동자’라고도 불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4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채 실제로는 일반 노동자처럼 근무를 하는 사무직과 학원 강사, 호텔 노동자 등의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했지만 고용주의 압력으로 포기하거나, 고용 형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고용주가 제시한 위탁계약서를 쓰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한 학원 강사는 코로나 사태로 학원이 휴원하고 나서야 자신이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무급휴가 상태에서 원생 관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노동자성’이 있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중 9개 직종, 약 77만명부터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전속성’이 강해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직종이다. 반면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특고 노동자 가운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통 프리랜서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속성이 결여된 근무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위장 프리랜서’들은 사실상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고용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성 판단의 주요한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일부 고용주들이 청년 실업난과 코로나발 고용 충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위장 프리랜서’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위장 프리랜서처럼 당연히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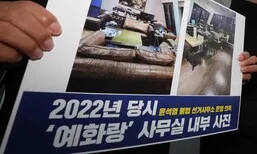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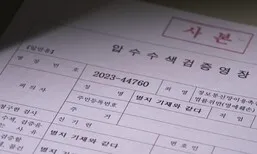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사람에 충성 않는다” 난장판 된 내란재판 정화한 참군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025604065_20250422502384.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