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은 하위 20% 계층(소득 1분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분위의 소득 감소 원인을 두고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경기 부진 등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특히 고령화 영향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위 가구 중 가구주가 70살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1분기 36.7%에서 올해 1분기 43.2%로 치솟았다. 70살 이상 가구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고 사회안전망마저 취약한 탓에 노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살 이상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6.7%로, 전체 가구 평균(13.8%)의 3배가 넘는다. 소득 격차가 악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물론, 고령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또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했다.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반면, 우리는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회원국 평균(12.4%)의 4배에 이른다.
인구 구조상 고령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해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1차적으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험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여파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성과 함께 노인 인력의 활용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자리 확충과 함께 복지정책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근로소득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기초연금을 더 올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퍼주기 공세’에 휘둘리면 아무 일도 못 한다. 증세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복지 확대와 증세’ 카드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관련 기사 : 늙어가는 ‘최하위 계층’…28년 새 1분위 가구주 평균 38살→63살
▶ 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소득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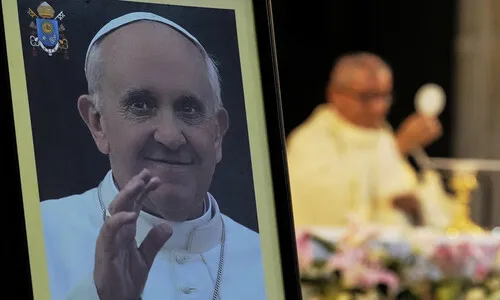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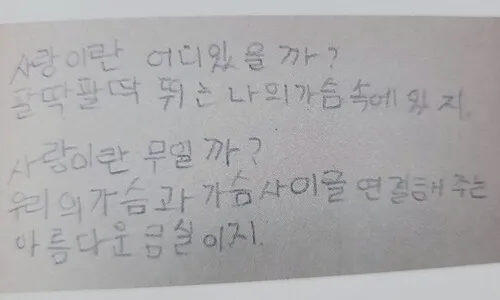


![[속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국힘 2차 경선 진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53_17453155058534_621745315486997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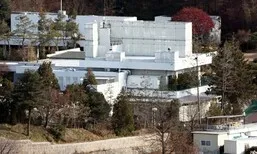


![[사설] ‘2+2 관세 협상’, 미국 속도전에 끌려가선 안 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53_17453139020884_20250422503373.webp)
![트럼프의 약점 [유레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17453106156552_20250422503251.webp)










![[단독] “전광삼 수석, 명태균에 ‘오세훈 공표 여론조사’ 언론사 연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2/53_17453132036042_20250422503407.webp)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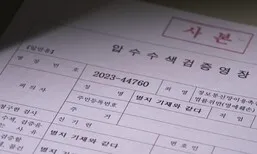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사람에 충성 않는다” 난장판 된 내란재판 정화한 참군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025604065_20250422502384.webp)
![<font color="#FF4000">[속보] </font>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국힘 2차 경선 진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155058534_6217453154869974.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출국한 ‘홍준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측근 “검·경 연락 없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123741052_20250422503352.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전광삼 수석, 명태균에 ‘오세훈 공표 여론조사’ 언론사 연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2/53_17453132036042_2025042250340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