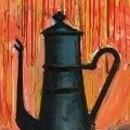Q&A 영역
있다면 그 인물의 업적도 간단히 적어주세요 ^
내공 40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강원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한 인물 소개
* 강영규(姜永奎) 진주 강씨의 후손으로 통정대부를 지냈다. 그는 영조 41년(1765년) 진주에서 동해 삼화리로 이주하였다.(眞珠誌)
* 고봉익(高鳳翼) 제주 고씨의 후손으로 자는 용업(勇業)이다. 그는 김학묵(金學黙)의 제자로 동해 송정에 살았다. 그는 모친 병환에 극진히 간호하였고 부친이 병으로 눕자 온갖 약을 다 써서 돌보아드렸다. 결국 부보가 돌아가서 두 번이나 시묘를 살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제수를 준비하여 50여리나 되는 거리를 거르지 않고 성묘를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에 반드시 묘역단장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성실 근면하고 스승을 섬기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아 좋은 음식이 있으면 대접해 드리고, 사모님 제사에도 제물을 드리기도 하였다. 그는 동몽교관(童蒙敎官) 벼슬을 받았고 고종 28년(1891년) 여름에 살아서 효자상을 받았다. 현재 그를 기리는 효자각이 부곡동에 남아 있다.(臨瀛誌)
* 고신명(高信明) 제주 고씨의 후손으로 호는 운암(雲菴)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훈련첨정(訓練僉正)을 지냈다. 그는 1720년 전라북도 무안에서 삼척지방으로 이주하여 1758년 동해 송정에서 사망하였다.(東海村史記)
* 고욱(高煜) 어머니가 병이 들자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내어 바쳤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공기택(孔基澤) 처 채씨(蔡氏) 평강 최씨의 후손으로 공씨 집으로 출가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청춘에 죽자 장삿날에 따라 죽으려고 목을 매었지만 집안 식구들이 풀어 놓고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한평생 고결하게 살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양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가문을 빛나게 하였다.(眞珠誌)
* 공병대(孔炳大) 부곡 공씨의 후손으로 그는 모친상을 당하여 1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는 형 병학이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어서 형 대신에 먼동이 틀 때 눈비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성묘하였다. 향교에서 그를 효자 표창하였다.(眞珠誌), (三陟郡誌),
* 공석방(孔錫方) 곡부 공씨의 후손으로 호는 의암(義菴)이다. 그는 동해 쇄운리에 살았는데 효심이 남다르고 부모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다. 그는 부모상을 당하여 삼년간 시묘를 하고 그 후에도 매일 성묘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유림에서는 그에게 과가 응시를 추천하였고 김병해(金秉諧)가 행장을 지었다.(眞珠誌)
* 권훤(權煊) 안동 권씨의 후손으로 호는 삼은(三隱)이다. 그는 첨추(僉樞)를 지냈으며 문장과 시에 능했다. 강릉 오죽헌에서 동해 송정으로 이주하였다.(三陟郡誌)
* 길남(吉男) 그는 최택(崔澤)의 사노(私奴)였는데 주인 부부가 모두 죽고, 다만 세 살짜리 어린애만 남았다. 그래서 그는 주인집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제 집의 사당을 지키고 제사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펴 길렀다. 이는 사대부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고(金沽) 김인존의 아우이다. 풍채가 아담하고 고우며, 문장과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이 드러났다. 벼슬이 시랑평장사(侍郞平章事)에 이르렀다. (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광유(金光裕) 삼척 김씨 위옹(渭翁)의 후손으로 고려 공민왕 때 중랑장(中郞將)으로서 홍건적을 평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리공신(輔理功臣)에 책봉되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벼슬을 높이고 총애하였다. 우왕 때에는 충신 불사이군이라는 신념을 지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귀향 후에 주로 채식을 하며 낚시로 세월을 보냈다.(三陟郡誌)
* 김광윤(金光胤) 부모가 동시에 죽었는데, 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른 뒤 또 어머니의 상복을 입었다. 중종(中宗)과 인종(仁宗)이 죽자 그를 위해 각각 3년 동안 상제와 같은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광을(金光乙) 김주원의 후손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찬화공신(贊化功臣)이 되고, 명원부원군(溟源府院君)에 책봉되었다.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다. (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광필(金光弼) 삼척 김씨 후손으로 호는 포서(浦西)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고 적이 있어서 자신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이 상을 당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빚이 있는 사람이면 그 문권을 불살라 버리기도 했다.(眞珠誌)
* 김광회(金光會) 1939년 출생 한양공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좌관과 행정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경남, 강원도 담당관을 지냈다.(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건회(金健會) 1938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명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부 사무관, 부산대 총무과장, 한국체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겸(金謙)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지흥리에 살았다. 그는 영흥교수(永興敎授)를 지냈다. 그는 모친이 병위 위독할 때 손가락을 끊어 간호를 해드렸더니 병이 나았다고 한다. 또한 부친상을 당해서는 시묘살이를 하면서 매일 묘에 엎드려 슬피 우니 벌레들조차도 슬퍼하며 떠날 줄 몰랐다고 한다. 이 고을에서 그의 효성이 대단하다고 칭송하니 선조 11년(1578년) 나라에서 표창이 내렸다. 부사 허목이 효자각을 짓고 제사를 올렸다. 그는 북평 삼대 효자 중의 한 사람으로 칭송받았다. 효자문이 홍수로 유실되자 동회리에 다시 세웠으며 김흥지(金興志)가 글을 지었다. 현재 효자각은 동해시 효가동에 있으며 9대손인 김억룡(金億龍)이 지은 기문 이외에 상량문과 효자비가 남아있다. (眞珠誌),(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東海村史記)
* 김규진(金圭鎭)(1868년〜1933년) 남평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송정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해강(海崗)이다. 그는 소남 이희수의 제자로 근대 한국서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8세 때부터 외삼촌인 소남에게 글씨를 배우다 18세가 되면서 청나라에서 10여년간 유학하였다. 그는 글씨도 뛰어나고 특히 풍경화(山水鳥)와 난죽(蘭竹)을 잘 그려 명성이 높았다. 그는 영친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였으며, 만재 홍낙섭과는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는 서화연구회창립, 서화전시회 개최 등 서화예술 발전에 힘썼다. 그의 저서로는 [난죽보(蘭竹譜)],[서법진결(書法眞訣)],[육체필론(六體筆論)] 등이 있으며, 희정당(熙政堂), 국조전(國造殿), 덕수궁(德壽宮), 태극전(太極殿) 등 80여점의 필적이 남아있다.
(분토기2, 김영기)
* 김규영(金奎榮) 1940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는 동해묵호농협이사, 동해축협이사, 묵호임협이사를 거쳐 2002년에 동해농협조합장을 지냈다. 전국 새농민상을 수상하였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기권(金起權) 해방 직후 민족청년단장으로서 청년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한국전쟁 때에는 방위군 대장으로서 지역 방위에 최선을 다했다. 1957년에 당시 동지였던 김일규씨 외 23명이 심곡동에 추모비를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기문(金起文) 삼척 김씨 후손으로 명종 16년(1561년)에 음사(蔭仕)로 사전(師傳)이 되었다가 제조(提調)벼슬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까지 호송한 공이 인정되어 선조 37년(1604년)에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책정되었고 진성군(眞城君)으로 책봉되어 철권(鐵
券)을 받았다. (眞珠誌)
* 김남석(金南錫)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초구에 살았다. 그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조모상을 당해서는 5일 동안 먹지 않았다. 병이 나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약을 다렸다. 그는 3년 동안 상막 밑에 꿇어 앉아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특별한 일 없이는 외출하지도 않았다. 그 후 당대의 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나라에서 그에게 표창을 내렸다.(東湖勝覽)
* 김남용(金南容) 1930년 동해출신으로 영주지방철도청 동해기관차-객화차보선사무소 서무계장을 거쳐 1984년 삼척향교의 동해향교 건립 추진위원회 총무,1999년에 북평라이온스클럽 회장, 제3대 동해향교 전교, 성균관 전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재)강원도향교재단이사장이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담(金譚) 효성은 하늘이 낸 것이었다. 부모의 상을 다하자 몸이 야윌 정도로 슬퍼하며 예법을 다했다. 아침저녁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잔에 따른 술이 스스로 말랐다. 거기에 조성된 석물(石物)은 단단해서 깎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석물을 부여잡고 소리를 내어 슬피 우니 석물도 먹줄을 먹인 대로 저절로 쪼개졌다. 국상(國喪)이 나자 두 차례 상복을 입었는데 한쪽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눈물을 글썽거렸으니, 이 사람은 충성과 효도를 타고나서 그러한 것이었다.
양사언(楊士彦)이 그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해 돋는 동해 바다 저 멀리 대관령[一嶺遠浮暘谷海]
오색 구름 찬란하게 봉황 연못에 잠겼네.[五雲深鎻鳳凰池]
어진 임금 갑자기 김담의 효성 소식 들으니[仁君倘聞金生孝]
돌이 쪼개지던 때 말라버린 술잔만 남았네.[只在盃乾石裂時]”
아들은 김경황(金景滉)과 김경시(金景時)이며, 김경황의 아들은 김한(金垾)인데 모두 효성과 우애가 있다하여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사효자행록(四孝子行錄)」을 지었는데, 4대에 걸친 5명의 원씨(袁氏)에 견주었다. 그 뒤에 고을 사람들이 ‘김담의 효성은 역사책에도 볼 수 없었던바’라고 했다. 손자 김속(金涑) 또한 효행과 우애가 있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덕기(金德起)의 처 채씨(蔡氏) 그녀는 평강 채씨의 후손으로 시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남편을 지극하게 공경하였다. 계묘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을 도와 3년상을 잘 치루었다. 그리고 남편이 병들어 눕게 되자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런데 새가 배를 물고 와서 남편에게 대접했더니 기적적으로 효력을 보여 남편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이후에도 계속 병석에 누워 지내다 이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부인 채씨는 32세였는데 같이 죽으려고 했으나 집안사람들에 발견되어 뜻을 이루지못했다. 그녀는 3년 동안 근신하면서 슬퍼하며 지내다 뼈만 남을 지경이었다. 무오년에 나라에서 열녀문이 내리고 그 남편에게는 호조참판이 내렸다. (東湖勝覽)
* 김덕장(金德璋) 효행으로 참판(參判)을 증직했다. 당시 사람들이 그의 마을을 가리켜 ‘효자리(孝子里)’라 했다. 문성공(文成公) 이이가 그의 집에 현판을 쓰기를 ‘효우당(孝友堂)’이라 하고 시를 지어 내걸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대(金臺) 과거에 합격해, 벼슬이 헌납(獻納)에 이르렀다. 손자인 김광철(金光轍)과 김광진(金光軫)에게도 모두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이 있었으며, 차례로 참판을 지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동성(金東星) 그는 90살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명하며 눈도 밝아서 의관에 수직되었다. (臨瀛誌)
* 김득룡(金得龍)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천곡리에 살았다. 그는 부모가 늘고 병들자 몸소 물을 길으며 절구질을 하여 부모를 공양하였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그는 영남지방까지 가서 양식을 구하여 강릉에 가서 생선으로 바꾸었다. 그 해 눈이 많이 내려 한길이 넘는 누길을 헤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님은 며칠을 굶어서 기진맥진한 것을 죽을 끓여 대접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극진한 봉양으로 부친은 104까지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났다. 나라에서 그를 가상히 여겨 숭정대부(崇政大夫)를 제수하였다. 그는 부모님 장삿날 비가 내려 땅을 팔 수가 없자 하늘을 보고 통곡했더니 비가 그쳐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그는 시묘살이도 삼년을 하였다.(陟州節義錄)
* 김명규(金明奎)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자는 치균(致均)이다. 그는 김유신의 후손으로 감찰을 지냈으며 순조 때 영주에서 동해 쇄운리로 이주하였다. (眞珠誌)
* 김맹경(金孟卿)의 처 박씨(朴氏)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그녀는 천성이 순후하여 남편을 섬기는 것이 지극정성이었다. 그녀는 술과 풍류를 즐겨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던 남편을 위해 많은 인내심으로 끝까지 불평 하나 없이 존경하였다. 이에 남편인 김맹경도 마음을 고쳐먹고 가문보존에 힘쓰게 되었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그녀가 이렇게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나라에 알려져 순조 22년(1822년)에 상이 내려졌다.(眞珠誌)
* 김목영(金睦榮)의 처 하씨(河氏) 진주 하씨의 후손으로 그녀는 17세 때 동해 송정리에서 출가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에 두만강 건너 러시아 땅으로 돈을 벌러 갔으나 그녀가 늙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평생 수절하고 살며 조카를 양자로 맞이하여 노후를 보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집을 나간 날을 제삿날로 전하고 제사를 받들었다.(眞珠誌)
* 김문기(金汶基) 1930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풍한산업(주) 판매부장, 문안섬유(주) 상무, 미륭건설(주) 상무이사, (주)한국자동차보험서비스 전무이사, 동부산업(주) 전무를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병우(金秉禹)의 처 방씨(方氏) 온양 박씨의 후손으로 동해 단봉리에 살았다. 시집간지 얼마 안되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정성껏 장사를 치루었다. 그녀는 남편이 1년 넘게 앓아 누워 있을 때 북두칠성에 기도하여 산돼지 피를 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종기로 고생할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기도 하고 송아지를 팔기도 하고, 위독할 때는 단지 주혈까지 해가며 시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녀의 효심이 세상에 알려져 순조 33년(1833년)에 유림에서 상을 내렸다.
(眞珠誌)
* 김병태(金秉泰)의 처 박씨(朴氏) 강릉 박씨의 후손으로 통훈대부 김병태의 부인이다. 그녀는 동해 단곡(단실)에 살았으며 남편이 창병으로 고생하자 입으로 고름을 빨았고 정안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으며 단지 주혈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쟁이가 ‘조상의 묘에 이상이 있으니 영혼을 위로하라’는 말을 듣고 눈길 속을 헤치고 찾아가 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누군가 조상의 묘 곁에 암장을 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여자의 몸으로 암장한 것을 파내어 버렸다. 그랬더니 남편의 병이 쾌유되었다. 그 후 남편이 죽자 그녀도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어린자식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몹시 슬퍼하며 절개를 지키고 살았다. 그녀의 이런 행실에 대하여 유림에서 여러 차례 상신하여 표창을 받았다.(眞珠誌)
* 김보헌(金寶憲) 그는 조선 철종 때 사람으로 호는 유헌(愉軒)이다. 그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여 1857년 대왕대비 김씨의 국상 때 상복을 입었으며 삭망 때는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는 부친이 병환으로 누워 위독할 때 단지주혈하여 10여일 간 더 연명하게 하였고 부친상을 당해서는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1885년 승지 윤상익(尹相翊)이 그의 효행을 고종께 올리자 예조참의 벼슬이 내리고 효자각을 세워 효행을 기리도록 하였다.
(동해문화 제3집, 2001, 동해문화원)
* 김복운(金復運)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유헌(楡憲)이다. 그는 동해 나안리에 살았는데 어머니상을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고종 12년(1875년) 홍수 때 꿈에 묘가 허물어져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달려가 보니 과연 홍수로 묘가 유실될 지경이었다. 그래서 묘를 이장하게 되었다. 그는 초하루와 보름에는 꼭 성묘를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발에 종기가 나서 고생할 때 그는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서 병이 낫게 하였다. 어느 해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차서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아버지를 업고 집안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물이 마당에 까지 넘쳐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기둥을 껴안고 하늘을 향해 울었더니 물이 줄어들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가 술을 몹시 좋아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가 술을 찾으시면 꼭 구해서 드리곤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위독할 때 단지주혈도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묘를 살았으며 해마다 섣달 그믐밤에는 묘에 찾아가 밤을 지냈다. 고종 22년(1885년)에 승지 윤상익(尹相翊)이 나라에 장계(狀啓)를 올려 나라에서 예조참의를 제수하였고, 영의정 조병식(趙秉式)이 글을 지었다. (三陟郡誌)
* 김상기(金上琦) 김주원의 후손이다. 그는 고려시대 과거에 합격해, 벼슬이 시랑평장사(侍郞平章事)에 이르렀다. 선종(宣宗)의 사당에 위패를 함께 모시고 제사지낸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상오(金相五)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농계(聾溪)이다. 그는 송천 최회혁(崔會赫)의 제자로 글도 잘 하고 글씨에도 능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석영(金錫榮)의 처 홍씨(洪氏) 남양 홍씨의 후손으로 동해 송정리에 살았다. 그녀는 후덕했으며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단지 주혈을 하고 남편이 죽자 기절하기도 했다. 그녀는 예법에 따라 정성껏 3년창을 마치기도 했다.(眞珠誌)
* 김선경(金善卿)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죽하(竹下)이다. 그는 인촌 김흥지(金興志), 휴당 최문혁(崔雯赫)에게서 배웠다. 그는 학문에 일찍 통달하고 필법이 정연하니 이연귀(李演龜)가 감탄하였다.(眞珠誌)
* 김선철(金瑄喆) 1939년 동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감사,민원담당관, 법원행정처 인사과장,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을 지냈다. (동해시사-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성규(金聖規) 그는 정조 13년(1789년)에 한산군수에서 삼척부사로 왔다. 그는 상부의 명령으로 전 부사 이헌경, 정일환, 감사 서정수, 영장 민광승 등의 비를 객사 앞에 옮겨 세웠다. 정조 14년(1790년) 7월 원자(元子)가 출생하자 그해 8월에 삼척부에 증광시 장소를 설치한바 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읍리 김종겸이라는 자가 관청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나 12월에 휴직을 하였고 다음에 정월에 퇴직하였다.(분토기2,김영기)
* 김성규(金星圭) 1940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앙대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이화섬유 사장, 한국 B.B.S 서울연맹회장, (주)동아주방대표, 신성금속(주) 대표이사를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성대(金星大) 의 처 손소사(孫召史) 그녀는 동해 평릉에 살았다. 어려서부터 효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가서도 조석으로 시아버지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언제나 시아버지의 의복을 깨끗하게 차려드렸다. 그 뿐만 아니라 80세인 시아버지를 위해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손자들이 함부로 할아버지 밥상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가르쳤다.(陟州節義錄)
* 김성표(金星杓)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신당(信堂)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품속에 간직하여 부모님께 드리곤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기를 앓을 때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으며 대변의 맛을 보고 약을 쓰기도 하였다. 일찍 부친을 여윈 것이 한이 되어 장성해서 3년간 시묘살이를 했으며, 할머니가 길러 주셨다하여 할머니 산소에서 3년간 시묘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계모에게도 효성을 다했으며 계모가 돌아가시자 역시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어느 때는 굶어서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 살려주기도 했다. 그는 학문이 높고 시문이 아름다워 영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 감사 서명선(徐命善)이 장계를 올리기도 했다. 진사 김종의(金宗義)는 그의 행적을 글로 쓰기도 하였다.(陟州節義錄),(眞珠誌)
* 김성혁(金性赫) 1938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카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묵호라이온스클럽 회장, 동해시 의사회장, 강원도립 삼척병원 외과과장, 원장, 천안시 성심병원 원장을 지냈으며 동해 , 동해 성모의원 원장이다. 그는 또한 동해대학장, 동해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강원도지사 표창과 보사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소사(金召史) 그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며 살았다. 그러다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녀가 죽어서 잔다골 할미바위 옆에 쓸쓸하게 방치된 것을 보고 부사 이규헌(李奎憲)이 민망하게 여겨 사재를 털어 후세까지 잘 보존하도록 하였다. (眞珠誌)
* 김수붕(金壽鵬) (1682년〜1750년) 그는 영조 3년(1727년)에 약천 남구만을 기리기 위해 약천사(藥泉祠) 건립을 주도하였다. (眞珠誌)
* 김순기(金旬起) 1939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앙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아영상업(주) 대표이사, 현대상운(주) 대표이사, 강동총상(주) 대표이사, 장백산통상(주) 대표이사, 회장, (주)진주산업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다.(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순하(金舜河) 동해 북평 효가리 출신으로 1919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한창일 때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신발 밑에 감추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송정보통학교와 삼척보통학교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함으로써 북평, 삼척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三陟市誌)
* 김시민(金時閔)·김시맹(金時孟) 어머니가 일찍이 병에 걸리자, 형제가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바치니 효험이 있었다. 정문을 세우고 ‘효도와 우애의 정문’이라 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시복(金時復)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동회리에 살았다. 그는 9세 때 아버지상을 당했는데 어른스럽게 장사를 잘 치렀다. 할아버지가 병환 중일 때는 밤새워 간병하였으며, 어머니상을 당해서는 3년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그는 늙어서도 매일 가묘에 분향했으며 중용(中庸)에 통달하였다. 그는 유림으로부터 여러 번 과거응시 추천을 받기도 했다. (眞珠誌)
* 김시중(金始重)의 처 최씨(崔氏) 그녀는 한림 최운부의 손녀이다. 남편이 병조(兵曹)의 낭관(郎官)으로 있으면서 휴가를 얻어 성묘하러 가던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목숨을 건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사내종이 와서 남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최씨가 곧바로 목욕하고 향을 피우며 하늘에 대고 빌며 사당에서 기도했다. 스스로 오른쪽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흰 솜에 적셔서 단단히 봉해 보내주었다. 그 사이 닷새가 지났으니 따뜻한 물로 굳은 피를 녹여 입에 흘려 넣어주니 과연 되살아났다. 숙종 때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시진(金始振)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조선 숙종 때의 무신이다. 숙종 2년(1676년)에 알성무과에 형과 함께 급제하였으며 그 후 망상으로 이주하였다. (三陟郡誌)
* 김시학(金始學)의 처 김씨(金氏)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송정에 살았다. 그녀는 25세 때 김시학과 약혼하였으나 그해 흉년이 들자 남편감인 김시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다른 사람과 정혼시키려 하였지만 그녀는 부모의 EMt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저는 이미 약혼한 몸이니 살아서는 그의 아내요, 죽어서는 그 집 귀신이지요.”라고 하며 그 집으로 가 64살까지 수절하며 살았다. 그의 손자 대영(大榮)이 비석을 세우고 이재현(李載現)이 비문을 썼다. 비문에는 “예나 지금이나 보기드문 일이로다. 삶은 아름답고 운명은 가련터라. 하늘이 정한 배필 귀신도 화합하니 송죽같은 그 절개를 그 뉘가 빼앗으랴.”하고 적었다.(眞珠誌)
* 김양(金陽) 신라시대의 인물로 김정여의 아들이다. 김명(金明)의 반란 때 신무왕(神武王)을 도와서 사직을 안정시켰다. 벼슬이 시중(侍中) 겸 병부령(兵部令)에 이르렀고, 죽은 뒤에 명원군왕(溟源郡王)에 책봉되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양겸(金養謙) 안동 김씨의 후손으로 그는 간성군수를 지냈으며 첨정(僉正)을 지냈다. 그는 경종 2년(1722년) 4월에 유배되었다. (眞珠誌)
* 김양보(金良輔)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부사 양필(良弼)의 동생이다. 중종 19년(152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파천할 때 용만(龍灣)까지 호송하기도 했다. 선조 37년(1604년)에 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을 지냈다. 충근공(忠勤功) 2등으로 척주군(陟州君)으로 책봉되었다. 후에 다시 정란공신(靖難功臣) 2등으로 책봉되었으며, 노비, 전결(田結),은자(銀子), 철권(鐵券) 등을 하사받았다.(眞珠誌),(陟州誌)
* 김양신(金養身)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훈도 김경상(金景祥)의 사위이다. 그는 음관으로 찰방(察訪)을 지냈으며 동추(同樞)가 되었다. 강릉 모전에서 동준(桐准) 신당촌(新塘村)으로 이주하였다.(眞珠誌)
* 김양필(金良弼)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조선 중종 5년(1510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좌도우후겸동래부사(慶尙左道虞侯兼東萊府使)를 지냈다. 그의 재임 시에 삼포에 왜구가 이를 잘 물리쳐서 그 공으로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책봉되었다.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 동회리로 낙향하여 내외객당을 구축하고 손님들과 더불어 술을 즐기고 활쏘기 등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부름이 있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고향에서 말년을 보냈다.
(眞珠誌),(陟州誌)
* 김언지(金彦之)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좌승지 김시진의 아들이며 조선 영조 때의 무신이다. 숙종 10년(168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숙종 33년(1707년)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였다. 그후 선전관(宣傳官), 주박(主薄), 판관(判官), 경력(經歷), 첨추(僉樞),오위장(五衛將),부호군(副護軍),내금위장(內禁衛將)등의 내직을 거쳐 진해현감, 순천 영장(營將)을 지냈으며 정조 18년(1794년)에 자헌대부(資憲大夫)가 되었다.(三陟郡誌)
* 김연관(金演觀)의 처 최씨(崔氏) 강릉 최씨의 후손으로 동해 이도리에 살았다. 그녀는 22살 때 남편을 잃고 한없이 슬퍼하며 울다가 몇 번인가 기절하였다. 청상과부로 시부모를 한평생 정성껏 모셨고 시부모가 돌아가시자 예법대로 장사를 치루었다. 그 후 양자를 맞이하여 가문을 잇도록 하고 조용히 남편을 따라가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사(主事) 김헌경이 그녀의 전기를 썼다.(陟州誌)
* 김연심(金演心)의 처 홍씨(洪氏) 남양 홍씨의 후손으로 동해 용정리에 살았다. 남편이 8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어도 백약이 무효하였다. 의원이 말하기를 뱀의 쓸개로 술을 담가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백방으로 힘을 써서 구하였고 젖을 빌어서 공경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칠성님께 남편 대신 자기가 죽게 해 달라고 빌었더니 신기하게 남편의 병이 완쾌되었다. 그 후 남편은 병석에 누웠고 이내 사망하니 장사를 치르고 삼우날 자신도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었다. 고종 10년(1873년)에 강원 감사 신응조(申應朝) 이 사실을 나라에 보고하였고 그 후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이 다시 나라에 장계를 올려 열녀문이 내리게 되었다. 고종 13년(1876년)에 열녀각을 쇄운리에 세우고 맞시숙되는 김연정이 그녀의 행적을 기술하였다.
(三陟郡誌)
* 김연의(金演義)의 처 최씨(崔氏) 강릉 최씨의 후손으로 동해 송정리에 살았다. 어느 여름철에 온 가족이 전염병을 앓아 남편이 죽고 말았다. 그런데 10여일 후 다시 시아버지마저 위독하기에 단지주혈하였으나 다음날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녀는 가난한 살림에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장사를 치루었다. 23살의 꽃다운 나이였으나 평생 절개를 지키며 살았다. 고을에서는 그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였으며 표창도 받았다. (三陟郡誌)
* 김연중(金演重)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봉정리에 살았다. 그는 하늘이 낳은 효자라 불리었다. 어버이를 섬기는데 언제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부친상을 당해서는 시묘살이를 했다. 또한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 대신 앓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는 단지주혈해서 어머니가 소생하고 연명케 하여 표창을 받았다.(三陟郡誌)
* 김연철(金演哲)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현종 3년(1837년)에 강릉에서 효가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도하(道下), 미로(未老) 두 면의 도훈장(都訓長)으로 천거되었으며, 현종 9년(1843년)에 동추(同樞)가 되었다.(眞珠誌)
* 김연철(金練喆) 1939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원주대 법률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내무부장관 비서관, 홍콩총영사관 영사 시카코총영사관영사,미국대사관외사협력관,교통방송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연효(金演孝)의 처 김씨(金氏)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용정리에 살았다. 그녀는 22살 때 남편이 사망하여 따라 죽기로 작정하였으나 늙은 시부모를 공양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을 돌려 먹고 장사를 예법대로 치르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 그녀는 자식에게 학문을 가르쳐 출세시켜 가문을 빛내도록 하였다. (眞珠誌)
* 김영(金泳) 삼척 김씨 위옹(渭翁)의 후손으로 고려 시대에 밀직사사(密直寺事)를 지냈으며 홍무(洪武)25년(1392년)에 고려가 멸망하자 송도로 올라가 관복을 벗고 두문불출하였다. 이성계가 여러 번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眞珠誌)
* 김영기(金永起) 1916년 강원도 동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강원도에서 교직에 종사하였으며 한성일보 지국장, 태양신문 삼척 특파원을 지냈다. 그는 동해사진연구회, 동해문화연구회, 유도회 동해시 지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특히 동해지역의 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동해문화사1,2,3집],[강원정도 600주년기념 동해사진집],[분토기1,2] 등이 있다. (분토기2, 김영기)
* 김영섬(金永暹) 예안 김씨의 후손으로 이조판서 문절공 담(淡)의 자손이다. 순조 때 영주에서 동해 쇄운촌으로 이주하였다.(眞珠誌)
* 김영지(金永智)의 처 정씨(鄭氏) 영일 정씨의 후손으로 그녀는 성품이 단정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동기간과 식솔들에게도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였다. 그녀는 순조 22년(1822년)에 표창을 받았다.(眞珠誌)
* 김예순(金禮順) 삼척 김씨 위옹(渭翁)의 후손으로 조선 선조 때 박제상과 더불어 홍월평 개간에 힘쓴 선각자였다. 그 공로를 인전받아 승지가 되었으며 농민들은 그를 기려 송덕비를 건립하였다.(眞珠誌)
* 김옥권(金玉權) 삼척김씨 위옹의 후손으로 동해 구미리에 살았다. 그는 부친이 병으로 눕자 3년 동안 하늘에 축원해서 눈 오는 날 청사(靑蛇) 구하여 약을 쓰니 부친의 병이 완쾌되었다. 부친은 90세까지 살았고 헌종 10년(1844년)에 감영에서 표창하고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다. (眞珠誌)
* 김용진(金容進) 1938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묵호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양구,횡성, 경북 상주경찰서장, 치안본부전경관리 근무과장,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지냈다. (동해시사-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우영(金宇榮) 그는 김택영(金澤宇), 박문익(朴文益)과 함께 1918년 천곡리에 보명학교(普明學校)를 세워 당시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신문학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썼다.
설립 후 동명학교와 통합되어 후에 송정공립보통학교가 되었다.(동해시사-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운기(金雲起) 1938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한국감정원 강릉, 청주, 부천 지점장, 한국감정원 지가정책 연구센터연구위원을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원상(金源相)의 처 이씨(李氏) 안성 이씨의 후손으로 그녀는 동해 동회리에 살았다. 그녀는 남편이 못쓸 병으로 앓아 누우니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여서 효험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끝내 숨지자 슬픔을 참고 자산을 모아 조상을 극진히 모셨다. (眞珠誌)
* 김원식(金源式)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천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6년(1879년) 정월에 감시(監試)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5월에 진사시 3등 제 9위에 입격하였다. 9품 종사랑(從仕史郞)이었던 그는 그후 수직으로 정 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특진되었다. 그는 유고집으로 [국재집(菊齋集)]이 남아있다.(三陟郡誌)
* 김원연(金源淵)의 처 홍씨(洪氏) 그녀는 남양 홍씨의 후손으로 18살에 출가하였는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남편이나 가족들과 화합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그녀가 31살 되던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 같이 죽으려 하였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3년상을 치렀다. 그 후 EKf을 출가시켜 가문을 빛냈고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여 집안을 보존하였다.(眞珠誌)
* 김원태(金源台)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석파(石坡)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 병환에 밤새워 약을 다리면서 변의 맛을 보고 하늘에 빌었더니 어머니의 병환이 나았다. 그리고 부친이 종기로 고생할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았고 상을 당해서는 시묘를 살았다. [禮儀] 6권을 편찬하였고 애통함을 못 이겨 44세에 세상을 떠나니 유림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표창이 내렸다. (三陟郡誌)
* 김원하(金元河) 1931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1982년 동해시 교육청 학무과장을 거쳐 동해시 교육장과 강원도 교육위원을 지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위(金偉)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세조 1년(1455년)에 좌익공신(左翼功臣) 3등에 책봉되었다.(眞珠誌),(世祖實錄)
* 김윤기(金允基) 1937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앙대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성신양회공업(주) 단양공장 생산본부장, 성신양회공업(주) 이사를 거쳐 신흥상사 사장이 되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윤수(金潤洙)의 처 김씨(金氏) 그녀는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심곡리에 살았다. 그녀가 20살 되던 해 남편이 위독하자 단지주혈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문을 잠그고 명주 수건으로 목을 매었으나 가족들이 발견하고 풀어 놓았다. 그 후 다시 묘 앞에서 통곡하고 나뭇가지에 목을 매었으나 이번에는 초동들이 발견하고 풀어 놓았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 다음 해 대상 날에 가족들이 잠든 사이 남편의 상막에 목을 매어 자진하였다. 철종 때 나라에서 특이한 행적이라 하여 열녀문이 내렸다. 철종 4년(1854년)에 건립된 선려(旋閭)는 쇄운동에 있다. (臨瀛誌)
* 김윤신(金潤身) 과거에 합격해, 벼슬이 사인(舍人)에 이르렀다. 향약(鄕約)의 규정을 조목조목 다듬었으며, 풍속을 바로잡았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응위(金應渭) 그는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송정에 살았다. 그는 모친 병환 때 이슬을 맞으며 밤새 기도를 올렸고 부친 병환 때는 학이 신에게 고하여 병을 고친 기적이 있었다. 그를 가리켜 마을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효자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부사 심동근(沈東瑾)이 찬(撰)한 글에 “옛날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하여 계모에게 대접한 왕상이와 눈속에서 죽순을 구하여 어머니를 공양한 맹종의 효성과도 같도다.”라고 하였다. 그는 부모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는 고종 19년(1882년)에 효자 표창을 받았고 박유향이 기문을 지었다. 송정동에 있던 그의 효자각은 동해항만공사로 현재는 동해 망상동 약천사 뒤편 언덕으로 이전되었다. (眞珠誌),(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인기(金寅基) 1938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강원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그는 1977년 강원도 지방과 기획예산계장을 거쳐 동해, 삼척, 태백시 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1995년 민선 1기 동해시장, 1998년 민선 2기 동해시장을 지냈다. 새마을 포상(대통령), 황희문화상, 허균문학상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인복(金仁福)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광해군 때 울진 훈도(訓導)를 거쳐 장예원 사평(掌隸院司評)을 지냈다. 그는 1580년경 송정으로 이주하였다. (三陟郡誌)
* 김인백(金仁伯)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가 돌아가시자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숙종 때 나라에서 효자문을 내리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臨瀛誌)
* 김인섭(金仁燮)의 처 숙부인 심씨(沈氏) 삼척 김씨 후손으로 동해 지흥리에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병이 위중했을 때 단지주혈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했다. 그녀는 초상을 치르면서 증석제를 올릴 때 따라 죽으려고 하였으나 시아버지가 눈물로 말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시아버지가 병으로 고생하자 산에 가서 빌었더니 호랑이가 감동하여 약을 가르쳐줘서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묘를 살았고, 그 뒤 남편의 제삿날에 남편을 그리며 자결을 하였다. 도백 민영위(閔泳緯)가 표창을 하였다. 그는 “남편 죽어 이를 따라 같이 목매어 죽으니 어찌 열녀가 아니드냐, 시아버지 가르침을 따르고 정성껏 모셨으니 어지 효부가 아니드냐”라고 칭송하였다. 고종 6년(1869년) 봄에 동해 효가리에 열녀각과 비를 세웠는데 찬정(贊政) 이재현(李載現)이 비문을 지었다.(眞珠誌)
* 김인지(金仁祉)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김인복(金仁福)의 동생이다. 그는 제용감 봉사(濟用監 奉事)를 지냈다. 선조 17년(1584년)에 외조부인 민달충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전토(田土)를 상속받아 봉사(奉祀)하였다.(三陟郡誌)
* 김인존(金仁存) 김상기의 아들로, 처음 이름은 김연(金緣)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했다. 젊었을 때 과거에 합격해, 직 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다. 여러 차례 벼슬을 옮겨 기거사인(起居舍人) 지제고(知制誥)와 병부 원외랑(兵部員外郞)을 지냈다. 요(遼)나라 사신 맹초(孟初)가 왔을 때에 김인존이 함께 모시고 다녔다. 하루는 함께 말을 타고 교외로 나가게 되었다. 눈[雪]이 비로소 개었고 말발굽이 땅에 부딪칠 적마다 소리가 났다. 맹초가 시를 지어 불렀다.
“말굽이 눈을 밟으니 마른 우레가 진동하네.[馬蹄踏雪乾雷動]”
김인존이 곧바로 그 소리에 맞추어 시를 지었다.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니 맹렬한 불꽃이 이네.[旗尾翻風烈火飛]”
맹초가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천재로다.”라 했다.
그는 벼슬이 수 태부 문하시중(守太傅門下侍中)에 이르렀다.
(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자의(金自義) 삼척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동명(東溟)이다. 그는 하위지의 조카사위로 벼슬이 판결사(判決事)에 올랐다. 단종의 양위로 벼슬을 그만두고 의주 용진(龍津)으로 낙향하여 풍월을 즐기면서 두문불출 하였다. 이조판서 김학성(金學性)이 비문을 찬(撰)하였다.
(眞珠誌)
* 김자현(金子鉉)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세종 8년(1447년)에 생원에 입격하여 음관으로 이천교도(伊川敎導)를 지내다 세종 29년(144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 병조정랑(兵曹正郞), 사헌부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외관으로는 청양, 청하 현감(縣監)을 지내며 많은 치적을 남겼다. 그는 만년에 낙향하여 강릉부(江陵府)에서 교수(敎授)를 지내며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는 무릉계곡의 산수 경관에 매료되어 쇄운리 취병산 밑에 터전을 잡고 정착하기에 이르렀다.(三陟郡誌)
* 김작(金焯)의 처 최씨(崔氏) 그녀는 혼인한지 3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 쌀 한 톨도 입에 넣지 않으며 함께 세상을 떠나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을 장사지낸 이튿날 몰래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장숙(金長淑) 1934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대 약대와 서울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그녀는 민정당 국책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2,13대 민자당 전국구 국회위원을 지냈다. 1995년 정무 제2장관을 역임하였다. (동해시사-제2장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재국(金載國) 1938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동해장 여관 대표이고 대한숙박업 동해시 지부장과 강원도지회 부회장이다. 1995년 동해시 의회의원(향로동)을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적(金玓)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김자현의 자손이다. 그는 몸가짐과 성품이 청아하고 고결하여 항상 자기 인격도야에 힘써 온 훌륭한 선비였다. 그는 동해 이도리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 마을이 풍수피해를 입지않도록 하였다. 후에 공조참의가 되었다.
(三陟郡誌),(眞珠誌)
* 김정기(金珵起) 강릉 김씨 국삼(國三)의 후손으로 정송사(鄭松史)에게 글을 배웠고, 만재 홍낙섭(洪樂燮)에게 글씨를 배웠다. 그는 필력(筆力)이 구슬을 뚫는다고 할 정도로 칭송을 받았다.(眞珠誌)
* 김정교(金政敎)의 처 이씨(李氏) 옥천 이씨의 후손으로 동해 평릉에 살았는데 남편이 고질병으로 10년 동안 고생할 때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고, 남편이 위독하자 단지주혈을 하여 3일간 소생하였다. 남편이 죽은 뒤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지내다가 성복을 하고 난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안 일 부탁하고 남편 무덤에 뛰어들어 세상을 하직하였다. 이 고을 유림에서 나라에 알리고 승지 한린호(韓麟鎬)가 장계를 올리니 나라에서 열녀문이 내리고 공조참판 정준화(鄭俊和)가 글을 지었다.(眞珠誌)
* 김정석(金正石) 1937년 동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동해시 시정자문위원, 동해시 재향군인회 이사, 감사, 어달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거쳐 1995년 동해시의원(어달동)을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정여(金貞茹) 신라시대의 인물로 김종기의 아들이다. 비로소 조정의 벼슬길에 나아가 직이 상대등에 이르렀다. 명원공(溟源公)에 책봉되었다. (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제익(金濟翼)의 처 김씨(金氏)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달방리에 살았다. 그녀가 19살살 때부터 남편은 19년 동안이나 종기로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녀는 그 종기의 고름을 입을 빨아내며 남편을 돌보았다. 그녀는 가정을 위해 남의 집 방아를 찧어주고 바느질도 해가며 살았다. 결국 남편이 죽자 청상과부가 되어 어린자식을 길렀다. 마을에서 열녀각을 세웠고 유림에서 상을 주었다.(眞珠誌)
* 김종정(金宗鼎) (1758년〜1835년) 그는 강릉향교 교정(校正)으로 영조 17년(1741년)에 훼손되어 없어졌던 약천사를 순조 1년(1801년)를 복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眞珠誌)
* 김종호(金宗虎) (1786년〜1868년)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망상 노봉에서 태어났다. 순조 14년(18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학(殿學)을 지냈으며 사헌부 지평(持平)을 중임하였고 순조 20년(1820년)에 이조정랑(吏曹正郞)을 거쳐 관직에서 물러났다. 헌종 4년(1838년)에는 자여도(自如道) 찰방(察訪)을 지냈으며 고종 3년(1866년)에 병조참의(兵曹參議) 에 제수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약천 남구만을 제향한 약천사가 강릉 신석으로 옮겨지자 이에 대한 기록을 [약천사실기(藥泉祠實記)]에 남겼다.
(藥泉祠實記),(동해의 뿌리)
* 김종희(金鍾禧) 1939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그는 안산경찰서 정보과장, 광명경찰서 정보과장,제2 건국위원회 과천시 부위원장을 지냈다.(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종후(金宗厚)의 처 홍씨(洪氏) 남양 홍씨의 후손으로 동해 봉정리에 살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 병이 나았다. 결혼해서 남편이 병들어 위독했을 때 단지주혈을 했더니 소생하였으나 끝내 죽게 되자 따라 죽으려 했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장삿날에도 약을 먹고 죽으려 하였으나 역시 죽지 못하고 살아 남았다. 그녀는 한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고 비단옷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철이 바뀔 때마다 옷을 만들어 남편의 무덤 앞에서 불사르곤 하였다. 자식이 장성하자 그녀는 어느날 집안일을 다 일러주고 약을 먹고 조용히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었다. 나라에서 열려문이 내렸고 부사 이인원(李寅元)이 그 행장을 찬(撰)하였다. 헌종 7년(1841년) 동해 대구동에 연려각을 건립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三陟郡誌)
* 김주원(金周元) 태종 무열왕(太宗武烈王)의 손자이다. 당초에 선덕왕(宣德王)이 죽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여러 신하가 정의태후(貞懿太后)의 명령을 받들어,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려하였다. 조카인 상대등(上大等) 김경신(金敬信)이 여러 사람을 위협하여 자신을 추대하게 한 뒤, 먼저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되었다. 김주원은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명주로 물러가 살면서 끝내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2년 뒤 김주원을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책봉하고, 명주와 익령(翼嶺),삼척(三陟)근을어(斤乙於)울진(蔚珍) 등의 고을을 떼어서 식읍(食邑)으로 삼았다. 자손이 이에 따라 강릉(江陵)을 본관으로 삼았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지안(金志顔) 과거에 합격해, 벼슬이 서윤(庶尹)에 이르렀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진(金縝) 학문에 힘을 써서 과거에 합격했다. 고려 인종(仁宗) 때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있었다. 이자겸(李資謙)의 난리 때에 궁궐이 연달아 불에 타는 것을 보고 탄식하기를, “적의 손에 죽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하고, 문을 닫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죽었다. 난리가 평정되자 그 절개를 기특하게 여겨서, 시호를 열직(烈直)이라 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진갑(金鎭甲) 1933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제1함대 부사령관,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을 지냈다.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동해시사-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진구(金鎭玖) 1936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이화여대 가정과와 미국 테네시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한양대 의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7년부터 중국연변대 겸직교수로 있다.(동해시사-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
* 김진구(金振九) (1906〜1987) 송정동에서 출생하여 제헌 의원과 초대 참의원을 지냈다. 1928년에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곡농장을 경영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지부장을 거쳐 제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산업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한민당(韓民黨)에 입당하여 당무위원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 부산 정치 파동 때에는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민권수호를 위해 재야 정치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민주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강원도의 민주당 책임자로 반독재 투쟁을 선도하였다.(三陟郡誌)
* 김진린(金振麟)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매헌(梅軒)이다. 그는 동해 심곡에 살았는데 학문과 덕행이 높았으며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 주었다고 한다. 그는 이 마을에 학문을 일깨워 준 약천 남구만을 추모하여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 그는 부친이 병으로 눕자 단지주혈하였으며 변의 맛을 보고 약을 썼다. 그러나 끝내 상을 당하자 피눈물을 흘리며 울자 풀이 마르고 시묘살이 3년 동안에 새들과 호랑이 두 마리가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슬퍼하였다고 한다. 고종 28년(1891년) 나라에서 효자문을 내리고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하였다. 시묘했던 근처에는 지금도 호랑이 바위가 있고 그 골짜기를 ‘어이넘이골(何越谷)’이라 한다.(臨瀛誌)
* 김진만(金振晩)(1918년∼2006년) 동해에서 태어나 일본 나니와 상고를 졸업했다.
그는 1954년 제3대 민의원을 시작으로 7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상공위원장, 공화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의정활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자료요약)
* 김진모(金振模) 1936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그는 동력자원부 광무국장,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본부장, 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을 거쳐 1993년 강원랜드 사장을, (주)강원랜드 복지재단이사장, 2005년에 한국장애인 스키협회장을 지냈다. 자랑스런지식인(사회공헌부문),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하였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진수(金振壽)(1902년-?) 그는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될 때 당시 송정공립보통학교 6학년이었다. 그는 삼척에서 3.1만세 운동에 대한 연락을 받고 주하영(朱夏英), 홍학현(洪學鉉)과 협의하여 재학생을 동원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三陟市誌),(동해의 뿌리)
* 김진수(金軫壽)의 처 심씨(沈氏)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삼화리에 살았다. 그녀는 남편이 병들어 누우니 그 곁에서 야윈 몸으로 3년 동안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이 되면 약을 다려서 간병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하늘에 빌고 산신령께 기도하며 대신 앓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녀의 정성과 백약이 무효하게 마침내 남편이 세상을 뜨자 같이 죽으려 했지만 늙은 시아버지와 어린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성원(大聖院)에서 표창하였다. (眞珠誌)
* 김진용(金振容) 1939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동아대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축협중앙회 비상계획실장, 동 미아동, 성내동 지점장, 축산종합연수원 교수부장, 축협중앙회 강원도지회장, 축협중앙회 참사를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천(金遷) 이 고을의 아전이다. 고종(高宗) 말년에 몽고(蒙古) 군사가 침입해서 어머니와 아우 김덕린(金德麟)이 포로가 되었다. 그때 김천의 나이 15살이었는데,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포로가 된 사람이 도중에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상복을 입고 장례를 마쳤다. 그 뒤 14년 만에 백호(百戶) 습성(習成)이 원(元)나라에서 와서, 김천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김천은 어머니가 북주(北州) 천로채(天老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만나서, 백금(白金) 55냥을 대신 바쳐서 돌아오게 했다. 그 뒤 6년 만에 김덕린도 돌아왔다. 형제가 종신토록 효도를 다하니, 고을 사람이 비석을 세우고 ‘효자리(孝子里)’라 새겨서 그들의 효성을 드러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추(金錘) 김광을의 아들이다. 그는 벼슬이 조선시대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다.
(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김충무(金忠武) 안동 김씨의 후손으로 효종 때 동회리(桐淮里)로 이주했으며 벼슬은 사과(司果)를 지냈다. 그의 아들 주명(周溟)은 부사를 지냈다.(眞珠誌)
* 김충하(金忠夏)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동해 송정리로 이주하였다. 그는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양치기 노인으로 처세하다 이조 숙종 을축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철종 임술년에 가선대부 병조 참판이란 벼슬을 받았다고 한다.(眞珠誌), (東海村史記)
* 김태호(金泰鎬)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홍규철(洪圭哲)의 문인이었으며 도량이 넓고 시도 잘 지었고 그림도 잘 그렸다. 그는 형 계호(啓鎬), 동생 건호(建鎬) 등과도 우애가 남달랐고 효성도 지극하였다. 경인년에 그의 조카 원달(源達)이 연방(蓮榜)에 올랐으며 병신년에는 창의(倡義)로 궐기하였다. 김원갑(金原甲)이 그의 비문을 썼다. (眞珠誌)
* 김학묵(金學黙)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송고(松皐)이다. 그는 동해 송정에 살았으며 학문이 높고 덕행이 있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 몇 번 기절을 했으며 부친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장사를 치른 뒤에 매일 성묘를 하였다. 부친상을 당해서는 3년간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생전에 부친이 좋아하셨던 은어를 제사 때에는 반드시 구하여 올리곤 하였다. 그는 한평생 조석으로 조상 사우(祠宇)에 분향했으며 서당을 개설하여 인재양성에도 힘썼다. 그는 의례법을 기록한 [의예집설(疑禮集說)] 두 권과 [심성잠(心性箴)],[학규(學規)]를 편찬하였다. 고종 28년(1891년) 승지 이면주(李冕宙)가 나라에 장계를 올리니 효자문이 내리고 감찰이 증직되었다. 영상(領相) 민영상(閔泳商)이 찬하였다. 1892년 이조참판이 증직되었으며 김병익(金秉翼)이 비문을 지었다. (三陟郡誌)
* 김한경(金漢卿)의 처 정씨(鄭氏) 영일 정씨의 후손으로 동해 쇄운리에 살았다. 그녀는 남편이 병들어 위독했을 때 단지주혈했으며 여러 가지 약을 구해 써서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고생한 보람도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초상을 치르고 성복날 밤에 약을 먹고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조 때 나라에서 열녀문이 내렸다. 정조 1년(1777년) 큰 홍수로 열녀문이 유실된 것을 철종 3년(1852년)에 동해 쇄운리에 재건하였고 구봉(九峯) 김구혁(金九爀)이 행장을 지었다. (陟州誌)
* 김학식(金學式)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추봉(秋峯)이다. 그는 날 때부터 성질이 특이하고 학문과 서예가 뛰어났으며 여러 정자의 액자를 썼다. (眞珠誌)
* 김헌경(金 ??金+憲?? 卿)(철종 2년(1851년)〜1910년)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휘남(輝南)이다. 그는 동해시 봉정에서 출생하였으며 기질이 강인하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며 경서에 해박하고 문필에 뛰어났다. 을미의병 때 창의장(倡義將)으로 추대되어 관동의병장 민용호(閔龍鎬), 심홍택(沈鴻澤)과 더불어 강릉에 집결하여 원산에 있는 왜군을 공략하려고 1896년 2월 6일에 신평에 도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왜군의 공격을 피하여 삼척 갈야산까지 후퇴하여 해산하고 말았다. 그는 관영(官營)에 체포되었으나 어명으로 사면되었다. 1908년 삼척군수서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때 전국적으로 유림의 신구세력 간 갈등으로 이를 조정하려하였으나 오히려 의병장이었다는 모함을 받아 2년형을 언도받고 경성감옥에서 1910년에 옥사하였다. 유림이 궐기하여 그의 유해를 돌려받아 유림장을 치렀다. 그는 1977년에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다. (강릉김씨 한림공파 문헌록)
* 김형권(金亨權) 금령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송정리에 살았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다. 그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모친에게 효성을 다하며 살았다. 그러나 19세에 모친상을 당하자 슬퍼하며 3년 동안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조상묘를 잘 가꾸었다. 그는 제삿날이 되면 제수를 많이 장만하였고 일가친척의 제사에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 마을에서 그를 표창하고 석남(石南) 홍순석(洪淳錫)이 전기를 지었다. (眞珠誌)
* 김형동(金炯同)의 처 김씨(金氏)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 북평리에 살았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함경도 덕원에서 사망하자 먼 길을 빌어먹어 가며 시아버지 유골을 이고 동해로 왔다. 그 후 시아버지 유골이 닿았던 곳에는 머리털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서 하지 못한 효성을 다하여 삼년상을 입었고 남편에게도 도리를 다하였다. 유림에서 그녀를 추천하여 도백이 상을 주었다. (眞珠誌)
* 김형배(金炯培) 1932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공단관리청 운영국장을 시작으로 여러 직급의 책임자를 거쳐 공업진흥청장,공업표준협회장,소비자보호원장,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동부그룹 제조부문(제강, 화학, 건설)회장, 동부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홍조, 청조, 황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형소(金炯昭) 1939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삼척대 화학공업학과 학과장과 도서관장을 지냈다.(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형순(金炯淳) 1938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1986년 삼척시 산업과장을 시작으로 동해시 수도과장 등 여러 부서의 과장을 지냈다. 2000년 민예총동해시 지부장을 지냈으며 무릉재 추진위원이다.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형택(金亨澤)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그는 가문을 잘 지켰고 부친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호랑이가 항상 지켜주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사촌 동생 김하택이 중병으로 고생할 때 뱀을 구하여 병을 고치게 하였다고 한다. 호암 김종의(金宗義)가 행장을 지었다. (陟州節義錄)
* 김효지(金孝之) 강릉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야암(野菴)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는 겉치레나 공명심이 없었으며 분수에 따라 살며 늙도록 힘써 성현의 말씀이 적힌 서적을 접하며 살았다. 지사(地師) 윤세웅(尹世雄)이 동해 봉정의 집터를 지정했다고 한다. “위악위인재일심 난어반수시기심(爲惡爲仁在一心/難於盤水是其心) ”이라는 자경시(自警詩)가 유명하다. (眞珠誌),(三陟郡誌)
* 김효원(金孝元) 조선 선조 때 동인(東人)의 중심인물로 호는 성암(省庵)이다. 그는 1575년 12월에 삼척부사로 부임하였다 1578년 4월 부친상을 당하여 떠났다. 이 고을 사람들은 그를 사모하여 인조 9년(1631년)에 향교 동쪽 기슭에 경행사(景行祠)를 세우고 봄가을에 제사지냈다. 또한 순조 24년(1824년)에 문정공 허목을 추향하였다. 그 후 경행사는 1828년 송정으로 이전하였다.
그는 삼척부사 재임 2년 동안 지방학자들과 교분이 두텁게 지냈으며 항상 무릉계곡을 탐방하여 두타산일기를 썼다. 그로부터 85년 뒤에 삼척부사로 왔던 허목은 두타산에 대해 말하기를 무릉계곡의 명승이름을 김효원이 지었다고 하였다. (분토기,(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동해지부)
* 김후경(金厚卿) 1930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북평,근덕, 도계중 교사를 거쳐 국사편찬위원회 편사관, 연구관, 조사실장, 자료관리실장을 지냈다. 그는 또한 매월당학학술원장, 한국학연구원이사, 민족정기수호 중앙본부 상임고문을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훈(金勳)(1546년∼1567년)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부사 김양필의 아들이다. 그는 음사로 첨정(僉正)을 지냈으나 혼탁한 정치에 실망하여 명종 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구호동에 살았다. 그는 구호동 산정에 만경대를 짓고 구호에서 도롱이와 삿갓 차림으로 낚시와 자연을 즐기며 살았다.(三陟郡誌)
* 김흥경(金興卿) 1927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관동연탄 대표, 민정당 중앙위원, 관동연료(주)대표이사 회장, 동해식품회장이다. 또한 동부 강원복지재단 이사이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김흥일(金興一)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호는 오정(梧亭)이다. 그는 동해 효가리에 살았으며 홍헌기(洪憲基)에게 글을 배웠다. 그는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병으로 눕자 3년 동안 약 다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버지 장사 때 꿈에 백발노인이 묘자리를 가르쳐 줘서 그곳에 묘를 썼다. 그는 어머니도 효성을 다해 모셨다. 일가 어른인 김학조(金學祚)와 보본단(報本壇)을 지어서 선조들의 제사를 올렸고 족보를 만들었다. 후에 그에게 호조참판이 증직되었다. (陟州節義錄)
* 권연(權璉) 기묘년(1519, 중종 14) 사마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화(士禍)가 장차 일어나리라는 낌새를 알아채고 여러 차례 효렴과에 추천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지조에 감탄하며 따랐다.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에 실려 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권육(權稑) 아버지가 병이 들자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내어 바쳤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권처직(權處直)의 처 김씨(金氏) 그녀는 임진왜란 때 난리를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갔다. 적병이 그의 아리따운 용모를 좋아하여 욕보이려 했다. 김씨가 칼을 빼앗아 제 몸을 찌르면서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 적병이 성내며 살가죽을 찢어 죽이고 떠났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권흥익(權興益) 과거에 합격해, 벼슬이 도사(都事)에 이르렀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권흥태(權興泰)의 처 유씨(柳氏)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항상 짧은 칼을 품고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할 때마다 집안사람이 알아채서 겨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스스로 ‘죄인(罪人)’이라 말하면서 대문 안의 뜰에도 나가지 않았다. 색도 무늬도 없는 흰 소복(素服)을 입고 평생을 지냈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나종옥(羅宗玉) 금성 나씨의 후손으로 강릉 금진에서 동해 송정으로 이주하였다. 병조참의가 증직되었다. (眞珠誌)
* 나택수(羅澤洙) 1940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강원학생교육원 연구사, 양구여중 교감, 봉화여중 교감, 홍천 화천중학교장을 지냈다. 문교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남과(南薖) 영양 남씨의 후손으로 군수 남득공(南得恭)의 아들이며 목사 남회(南薈)의 동생이다. 태종 12년(1412년)에 생원시에 장원 급제하였다. 산수의 정경을 즐겨 울진현 소로촌에서 봉정리로 이주하였다. (眞珠誌)
* 남구만(南九萬)(인조7년(1629년)〜숙종 37년(1711년) 의령 남씨 남지(南智)의 8대손이며 현령 남일성의 아들이다. 호는 약천(藥泉) 또는 미재(美齋)이다.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으로 효종 2년(1651년)에 사마시를 거쳐 1656년에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57년에 정언(正言), 현종 1년(1660년)에 이조 정랑에 이어 집의(執義), 응교(應敎), 대사간(大司諫), 승지를 거쳐 1668년에 안변부사(安邊府使), 전라도 관찰사(觀察使)를 지냈으며 1674년에는 함경도 관찰사로서 유학을 진흥시키고 변방 수비를 확고히 하는데 힘썼다. 숙종 초 대사성(大司成), 형조판서를 거쳐 1679년에 한성부(漢城府) 좌윤(左尹)을 지냈다. 그는 서인(西人)으로서 남인(南人)을 탄핵하다가 남해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이듬해에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도승지(都承旨), 부제학(副提學), 대제학(大提學),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683년에 병조판서가 되어 폐사군(廢四郡)의 복치를 주장하고 무창(茂昌), 자성(慈城)등 2군(君)을 설치하였다. 이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으며 1684년에 우의정, 다음해에 좌의정, 1687년에 영의정을 지냈다. 숙종 15년(1689년)에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득세하자 망상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숙종 20년(1694년) 감술옥사 때 다시 영의정으로 기용되었으며 1696년에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1701년에 희빈 장씨를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김춘택, 한중혁 등 노론의 주장에 맞서 가벼운 형을 주장하다가 숙종이 희빈장씨의 사사를 결정하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숙종 33(1707년)에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그는 시와 사화에도 능했다.[청구영언(靑丘永言)]에 그의 유명한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전한다.
그 시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동창이 밝았는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쇼칠 아해난 여태 아니 니러나냐
재너머 사래 긴 밧츨 언제 갈려 하나니
이 시조는 그가 망상에 기거할 때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일에서 앞산 발락재를 넘으면 저멀리 형제봉 기슭에는 긴밭(長田)지명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음을 볼 때 그의 시조 배경이 이 곳임이 분명하다. 망상바다에서 해가 솟으면 종달새는 반공에서 봄을 알리는 노래를 지저귄다. 거기에낭만이 깃들어 있음직도 하나 그는 그것을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해석가들 중에는 이 시조를 권농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작가 자신의 삶과 사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의 표현이라 짚어볼 수 있다.(분토기2, 김영기)
그는 문집으로 약천집(藥泉集)을 남겼고 저서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註)]가 전한다.
그는 망상 약천 마을로 유배를 왔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학문과 생업에 힘쓰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약천사(藥泉祠/魯谷書院)를 세워 그의 학문을 기리고 후학들의 학문진작에 힘썼다.(동해시사-제2장 동해시의 향토인물),(분토기2, 김영기)
* 남응문(南應文)의 처 민씨(閔氏) 여흥 민씨의 후손으로 그녀는 남편 상을 당하여 예법대로 장사를 잘 치르었다. 그녀는 28년간이나 사철 남편 옷을 지어 불태워 주었다. 그 소문이 고을에 퍼져 선조 때 나라에서 표창하였다. (陟州誌)
농월산(弄月山) 삼척 관기로 황삼장쾌를 걸치고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이 천하일품이었다. 순조 6년(1806년) 당시 영월부사 신광수(申光洙)가 경포대와 죽서루를 구경하고 돌아갈 때 중대사 동구 밖에 사는 그녀를 찾아와 놀면서 읊은 글 한 수가 있다.(三陟郡誌)
‘臨別佳人月下歌/秋眉漠漠帶烟波/餘音轉入陽關調/不待明朝恨已多/中臺洞外水東流/一半斜陽白 領頭/聞唱送君千里曲/不如初別竹西樓’
(그대가 달보고 노래할 때/눈웃음이 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고/곡조는 구슬프기 한 없으니/내일 아침 애닯은 정 벌써 새기려나/중대동의 물은 동쪽으로 흐르고/해는 서쪽으로 기우누나/이별이란 이렇게 애닯은 건가/차라리 죽서루에서 헤어질 것을)
* 문이동(文里同) 그는 관노(官奴)였는데 임진왜란 때 관리들을 모시고, 깊은 산골로 피해 달아났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여러 날을 지냈지만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었다. 산밭의 겉곡식을 주어다가 손으로 짓이겨서 알곡을 내어 바치니, 마침내 모두 살 수 있었다. 뒷날의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문제홍(文濟弘)의 처 김씨(金氏)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그녀는 천성적으로 후덕하였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편을 정성껏 섬기었다. 집이 가난하여 겨울에는 칡을 캐러 다니고 봄과 여름에는 품을 팔아서 시부모와 남편을 봉양하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었다. 남편이 병이 들자 칠성단을 쌓아 놓고 밤마다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빌었다. 남편이 위독하여 단지주혈하였으나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림에서는 그녀를 열녀로 추천하였다. 열녀각은 1933년에 건립되었다.(東海村史記),(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문희주(文熙周) 남평 문씨의 후손으로 그는 당숙인 문계린이 후사가 없자 그 집의 양자가 되었다. 그는 양자가 되었지만 생부모와 양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그는 부친이 병석에눕자 극진히 병 수발을 들었으며 부친이 사망하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며 생전과 다름없이 묘소를 돌보았다. 1910년에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쇄운동에 효자각이 건립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효자각에는 제액, 효자문, 표창문이 같이 걸려있다.
(東海村史記),(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민달충(閔達忠) 여흥 민씨의 후손으로 참봉(參奉)을 지냈다. 연산군 때 강릉 조산에서 북평 용장촌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는 후사가 없어서 외손인 김인지(金仁祉)에게 전토와 가사를 물려주었다. (眞珠誌)
* 민백조(閔百祚) 여흥 민씨의 후손으로 판관 홍익석(洪益錫)의 사위이다. 결혼하여 취병산에 아래 살다가 망상을 거쳐 강릉 풍호로 돌아갔다. 영조 44년(1768년)에 진사에 급제하였고 문장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정조 15년(1791년) 7월에 강원 감사 윤사국(尹師國)이 강릉 문묘(文廟) 제사에 어포(魚脯)를 감축한 것에 대하여 지역 사림과 더불어 통문(通文)하고 또한 감사(監司)에게 상소하였다가 옥에 갇혔다. 결국 그는 홀로 추국(推鞫)을 당하다 선화당 앞 뜰에서 더위에 지쳐 사망하게 되었다.(眞珠誌),(臨瀛誌)
* 민사심(閔思諶) 아버지가 병이 들자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내어 바쳤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박공달(朴公達) 기묘년(1519, 중종 14) 효렴과(孝廉科)로 벼슬길에 올라, 벼슬이 병조 좌랑(兵曹佐郞)에 이르렀다. 타고난 성품이 순박하고 조심성이 많으며 효성과 우애가 두텁고 지극했다. 사화(士禍)가 일어나자 고향마을로 돌아가 조카 박수량(朴遂良)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일을 잊은 채로 지냈다. 향현사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낸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박광실(朴光實)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동해 송정에 살았다. 그는 7세 때 부친 병환에 뱀의 알이 좋다해서 겨울에 들판을 헤매며 울부짖었더니 뱀의 알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다시 부친이 잉어를 원하여 아내와 같이 갯가에 나가 하늘을 보고 울었더니 잉어가 나타나 원을 풀어 드렸다고 한다. 상을 당해서는 시묘살이를 하였다.(三陟郡誌)
* 박내빈(朴來賓) 그는 1929년 최윤달(崔潤達)(1911년〜1970년), 최춘희(崔春熙)(1911년〜1951년)등과 함께 삼척청년동맹에 가입하였고, 1930년에 삼척청년동맹 삼화리지부 간부로 활동하면서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1년 4월부터 1년간 북삼명 삼화리의 명화학원(明和學院)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계몽에 기여하였다. 그는 또한 최춘희 등과 비밀결사 북삼농민조합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쇄운리의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최대희(崔大熙) 등과 함께 농민운동을 통한 민족해방을 도모하기 위해 쇄운농민조합을 결성하고 중앙부 및 교양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농민조합은 삼척 출신 심부윤(沈富潤)이 원산에서 활동하던 윤일균(尹一均), 김덕환(金德煥) 등과 연결되어 노동조합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결성한 K회(會)가 주동이 된 것었다. K회는 삼척지역 노동운동,농민운동, 사상운동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최윤달도 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최윤달은 1933년 조합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내빈과 함께 금광사무소(金鑛事務所)를 습격하여 금괴 283돈과 현금 63원을 탈취하였다. 그런데 그후 농민조합이 발각되자 1934년 6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다음 해 10월3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았다. 이런 공적이 인정되어 그는 195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독립운동사 자료집,14집 269면)([판결문(함흥지방법원(1935.10.31))])
* 박내정(朴乃貞) 그는 숙종 36년(1710년) 2월에 삼척부사로 왔다가 5월에 사퇴하였다. 그는 척주 동해비를 정라 죽관도(竹串島)에 다시 세웠다. 현종 1년(1660년) 10월 소위 예론으로 삼척부사로 밀려나 허목은 손수 동해비의 글을 짓고 써서 이를 정라 만리도에 세웠으나 숙종 11년(1685년)에 풍랑으로 유실되고 말았다. 숙종 33년(1707년)에 부사 홍만기(洪萬紀)는 허목의 글씨를 다시 받아 비를 새겼으나 세우지 못하고 물러나자 후임이었던 박내정이 이를 세웠다. 박내정이 떠난 후 향민들은 쇄운도 산기슭에 그의 청덕비(淸德碑)를 세웠으며 동해시는 이 비를 1999년 천곡동 냉천공원으로 옮겼다.(분토기2, 김영기)
* 박무웅(朴武雄) 1940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영남대 기계공학과와 연세대 산업대학원을 나왔다. 그는 태백시 교육청 장학사, 강원도 교육위원회 기술과 장학사, 강원도 교육청 기술과 장학사, 원주공고 교감 등을 거쳐 철원교육장을 지냈다.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박문욱(朴文郁) 강릉 박씨의 후손으로 호는 학한(學閒)이다. 그는 강릉에서 계동(桂洞)으로 이주하였으며 벼슬은 첨추를 지냈다.(眞珠誌)
* 박삼수(朴三壽) 1932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숙명여대를 나왔다. 그녀는 강원도 새마을 부녀회 부회장, 동 회장 등을 지냈으며 천곡 중앙어린이집 원장이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박수량(朴遂良) 연산군(燕山君) 때 상례(喪禮)의 기간을 줄여 한 해만 상복을 입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박수량이 그 때 어머니의 상을 당했다. 박수량은 여전히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여막에서 삼년 동안 시묘살이했다. 영조 3년(1727)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고을 사람들이 사당에서 제사지낸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박순곤(朴淳坤) 1935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부산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묵호청년회의소 회장, 동해시 궁도협회장, 묵호탁주합동제조장 대표, 동해시 의원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박시형(朴始亨) 조선 시대 발영시(拔英試)에서 뽑혀, 벼슬이 승선(承宣)에 이르렀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박신산(朴兟珊) 밀성 박씨의 후손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봉평 북길산 밑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자 어머니를 모시고 창죽리에 와서 살았다. 그는 가선대부 품직을 받았다.(眞珠誌)
* 박억추(朴億秋) 효성으로 부모를 모셨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싱싱한 오리고기를 맛보고 싶어 했다. 돌멩이를 오리 한 쌍에게 던지니 둘 다 떨어져서, 아버지에게 드리니 병이 나았다. 명종(明宗) 때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효렴과로 발탁되어 벼슬이 청풍 군수(淸風郡守)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바로 박수량의 조카이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박영헌(朴永?金+?憲???)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조선 헌종 때의 무신이다. 그는 헌종 13년(1847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眞珠誌)
* 박오승(朴五昇) 1932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주)보람디자인 대표이사, 한국실내디자인협회장, 전문건설협회장, 한일인테리어디자인협회장, 디자인월드 회장을 지냈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박운혁(朴雲赫)의 처 송씨(宋氏)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가 병들어 누었을 때 단지주혈하여 아버지를 회생시켰다. 장성해서 박운혁의 처가 되었다. 그녀의 친정 어머니도 열녀다운 행실로 귀감이 되었다.(眞珠誌)
* 박준만(朴準萬)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아버지를 따라 청주에서 전주 봉루산(鳳樓山) 아래서 병사 생활을 하다가 동해 나안리로 이주하였다.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1902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眞珠誌)
* 박지생(朴芝生)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진사 박세영(朴世榮)의 손자이다. 그는 조선 선조 때 삼화동 홍월평(紅月坪)에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되자 당시 부사였던 신경희(申景禧)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숙종 15년에 이계(李桂) 등이 이 개간지를 팔아 넘기려 흉계를 꾸미게 되자 그의 아들 박사철(朴斯哲)은 농민들과 더불어 여러 차례 관가에 진정하여 보전하게 되었다. 그후 헌종10년(1844년)에 김시학(金時鶴)이 이곳에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현재 이곳은 삼화 시가지가 되었고 쌍용양회공장이 들어서 있다.(陟州誌)
* 박진의(朴振儀)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영조 때 밀양에서 동해 냉천리로 이주하였다. 그는 동추를 지냈다.(三陟郡誌)
* 박창운(朴昌雲) 밀성 박씨의 후손으로 호는 운암(雲菴) 이다. 그의 선조는 여주에서 강릉 학산으로 이주하였다가 현종 6년(1840년)에 동해 이로리 죽림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감찰을 지냈다.(眞珠誌)
* 박춘환(朴春興)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동해 천곡에 살았다. 그는 부친 병환에 단지주혈하였고 돌아가신 뒤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그는 부친의 묘를 단장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흙을 파다 쌓기도 했다. 그의 행실이 알려져 표창을 받았다.(眞珠誌)
* 배연수(裵延壽) 아버지가 일찍이 병이 위독했는데, 농어[鱸魚]를 맛보고 싶어 했다. 때는 겨울이라 널리 찾아도 얻을 수 없었다. 배연수가 바닷가로 가서 두 번 절하며 하늘에 대고 빌기를, “하늘이 이 물고기를 내려주시어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잠시 후 물고기가 과연 튀어나왔다. 뒤에 재랑(齋郞)에 임명하며 두 번이나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백채현(白彩鉉) 1933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삼척산업대 교수를 역임하였다.(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범일국사(梵日國師) (현덕왕 2년(810년)〜진성여왕 3년(889년) 신라 때의 고승으로 본 성은 김씨이다. 통효대사(通曉大師) 또는 품일(品日)이라고도 한다. 흥덕왕 때에 김의종(金義琮)을 따라 당나라 명주에 있는 개국사에 가서 마조(馬祖)라는 도승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공부하고 847년에 귀국하였다. 851년 백달산에서 수도하고 명주도독 김공(金公) 의 청으로 40여년을 굴산사(堀山寺)에서 지냈다. 그가 굴산사에 있는 동안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이 국사를 삼으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80세에 입적하였다. 선문구산(禪門九山) 중 도굴산파(闍堀山派)의 개조로서 삼화사(三和寺), 신흥사(新興寺),영은사(靈隱寺) 등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眞珠誌),(三國遺事),(陟州誌)
* 상우현(尙禹鉉) 목천 상씨의 후손으로 호는 북송(北松)이다. 그는 운봉(雲峯)과 삼척 진장(鎭將)을 지냈다. 그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동해 삼화에 정착했으며 심순모(沈珣模)와 더불어 거문고와 서책으로 우의를 다지며 지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서경추(徐景樞)의 처 권씨(權氏) 그녀는 서경추가 양양(襄陽)에 갔다가 우연히 중병에 걸려서 갑자기 숨이 막혔다. 사내종이 허둥지둥하며 황급히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 권씨가 곧바로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대통에 담아 보내어 병을 구했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서정길(徐貞吉)의 처 정씨(鄭氏) 영일 정씨의 후손으로 동해 북평에 살았다. 그녀는 인조 때 열녀의 행적으로 정문을 받았다. 부사 허목은 북평 오절부의 한사람이며 칭송하며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다. (陟州誌)
* 소복(小福) 삼척부 기생으로 강릉 선비 최곤축(崔坤軸)의 부인이다. 선조 13년(1580년)에 송강 정철이 관동순찰사로 이곳을 지날 때 그녀의 미색(美色)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동해 망상에 당도하니 이미 남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 정철은 그녀가 변변치도 못한 선비인 최곤축에게 시집을 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읊었다고 한다.
(臨瀛誌)
“咫尺仙娥一望祥床/ 碧雲迷海信茫茫/ 如今悔踏眞珠路/ 錯使行人也斷腸”
(아리따운 여인을 지척에서 바라보니/ 구름인지 물거품인지 허황하구나/
지금 진주로 떠나는 길손 애간장이 타는구나)
* 손달주(孫達周) 밀양 손씨의 후손으로 신라 시대 월성군(月城君) 문효공(文孝公)의 자손이다. 그의 조상은 논산에서 강릉 박일리로 이주하였고 다시 정선 직원리로 옮겨 살았다. 순조 때에는 달방리로 이주하였다. 병조참의를 지냈으며 홍인현(洪仁鉉)이 비문을 지었다.
신명화(申命和)의 처 이씨(李氏) 그녀는 남편의 병이 위독해지자, 이씨는 은밀히 조상의 무덤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하며 기도한 다음 마침내 차고 있던 작은칼을 뽑아 손가락을 끊고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다. 이씨에게 작은 딸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크기가 대추만한 약을 내려 주는 꿈을 꾸었더니 남편의 병이 과연 나았다. 영조 23년(1747)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신붕(辛鵬) 임진왜란 때 신붕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달아나 숨었다. 적병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자 신붕이 울부짖으며 애처롭게 비니 적이 버려두고 갔다. 어머니가 죽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는데, 한결같이 도리와 예법에 따랐다. 뒤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신세린(辛世麟)의 처 김씨(金氏)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로 다시는 머리를 빗고 낯을 씻지 않았다. 봄가을이 될 때마다 새 옷을 지어 무덤으로 가서 태웠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신승렬(辛承烈) 1935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동해시협의회 부회장, 동 회장, 새마을운동 동해시 지회장을 지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신해중(辛海重)의 처 함조이(咸召吏) 그녀는 외딴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깊은 밤에 사나운 호랑이가 그 남편을 물고 갔다. 함조이가 칼을 들고 따라가서 호랑이와 함께 싸워서 남편을 빼내어 돌아오니 그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뒤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심경국(沈經國) 삼척 심씨의 후손으로 홍하행(洪夏行)의 사위이다. 정조 때 강릉에서 송정리로 와서 살다가 다시 단곡(丹谷)으로 이주하였다. 학문과 의로운 행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三陟郡誌)
* 심경모(沈璟模)의 처 신씨(辛氏) 영월 신씨의 후손으로 동해 봉정리에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병이 위독할 때 단지주혈하였으며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말리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3년 상을 치르고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맞아 가계를 잇게 하였다.(眞珠誌)
* 심동노(沈東老) 고려시대의 문인으로 호는 신재(信齋)이며 삼척 심씨의 시조이기도 하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시문으로 명성이 높았다. 내서사인지제교(內書舍人知製敎)를 지냈다. 고려 말엽 해이한 정사를 바로 잡으려다 권문 귀족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명도산 기슭으로 돌아갈 것을 왕에게 청하니 왕은 그 뜻을 높이 사서 그에게 동노(東老)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그 이름의 뜻은 노인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그의 하직을 아쉬워한 목은 이색(李穡)이 학사승지(學士承旨)가 되어 왕에게 [심동로는 학식이 신보다 높고 나이도 신보다 연장자일 뿐 아니라 벼슬도 먼저 했으니 신의 직책을 그에게 내리십시오.]라고 간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김구용(金九容)이 안찰사(按察使)가 되어 그를 찾아가 신재(信齋)라는 당호를 써주었다. 그의 만년에 예의판서제학(禮儀判書提學)이 제수되고 진주군(眞珠君)으로 책봉되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三陟郡誌),(陟州誌),(臨瀛誌)
* 심명(沈蓂)의 처 최씨(崔氏) 그녀는 임진왜란 때 온 집안이 산골로 피했다. 적병이 갑자기 닥치니, 최씨가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집안사람에게 외치기를, “내가 몸으로 막아낼 테니 부모님과 기회를 엿보아 빨리 피하세요.” 했다. 적병이 또 욕보이려고 하니, 최씨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 재상의 며느리로서, 무슨 면목으로 욕을 당하고 살겠느냐?” 하고는, 두 젖가슴을 모두 잘라내고 끝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최씨는 비록 죽었지만 온 집안이 그 덕분에 모두 살 수 있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심언광(沈彦光) 찬성(贊成) 심언경(沈彦慶)의 아우이다. 벼슬이 이조 판서(吏曺判書)와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에 이르렀다. 늘그막에 경포호(鏡浦湖)의 어촌(漁村)에 살았다. 문장을 지으며 한가롭고 편안히 지내며 여생을 마쳤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심상길(沈相吉) 1934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묵호농협협동조합 이사, 성균관 강릉향교 장의, 동해시 망상동 노인회장, 성균관 동해향교 망상동 지회장이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심유국(沈綏國) 삼척 심씨의 후손으로 심경국(沈經國)의 동생이다. 강릉 당북(堂北)에서 동해 봉정(鳳亭)으로 이주하였다. 순조 29년(1829년)에 자기 집의 종인 노영(魯永)과 함께 해암정(海巖亭)을 중수하였다.(三陟郡誌)
* 심지렴(沈之濂) 아버지가 병이 들자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내어 바쳤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심지황(沈之潢) (1888년〜1964년) 삼척 김씨의 후손으로 동해시에서 출생한 근대 서화가이다. 호는 계남(桂南)이며,동해시 북평동 단곡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고향인 단곡은 경치가 좋아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는 이곳에서 북평팔경(北坪八景)과 북평팔영(北坪八詠)을 지었다. 소남 이희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고 소남 사후에는 만재 홍락섭에게 사사하였다. 그의 글씨는 위로는 윤백하(尹白下)의 기풍이 아래로는 홍낙섭의 체온과 서풍이 담긴 글씨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해서와 초서에 능했고 전서와 예서도 잘 썼다고 한다. 그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필법인 오지재력필법(五指齋力筆法)을 구사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글씨로는 동해시 무릉계곡의 [금란정(金蘭亭)]의 현액과 [금란회우도(金蘭會友圖)]등이 남아있다. 삼척시에서 그의 필적을 모은 [진주대관(眞珠大觀)]을 발간하였다.
또한 문집으로 [계남사집(桂南私集)]이 있다.(江原道誌)
* 심홍서(沈鴻書)의 처 정씨(鄭氏) 영일 정씨의 후손으로 동해 봉정리에 살았다.
그녀는 27세 때 남편이 죽자 “자식도 없는 몸이 살아서 무엇하리”하며 따라 죽으려 하였다.
그런데 “내가 죽고 없으면 늙은 시아버지를 누가 봉양하겠는가”하고 마음을 돌이켜 열심히 살며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봉양하였다. 그녀는 4년 동안 대변을 못보고 고생하는 시아버지를 위해 손가락으로 대변을 파냈으며 여러 가지 약을 구하여 치료해 드렸다. 그녀는 늙어서 양자를 입적시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니 마을의 칭찬이 대단하였다.(三陟郡誌)
* 양주인(梁柱仁)의 처 박씨(朴氏) 그녀는 밀양 박씨의 후손으로 양주인의 처로서 가난한 집안을 길쌈 방직으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남편이 죽자 조상을 잘 받들고 자손을 잘 가르쳐 가문을 빛냈다.(眞珠誌)
* 양필수(梁弼洙) 남원 양씨의 후손으로 철종 2년(1851년)에 아버지를 모시고 지평(砥平) 광탄에서 동해 이기리로 이주해 살다가 철종 6년(1855년)에 방현리(芳峴里)로 이주하였다.
벼슬로는 감찰(監察)을 지냈다.(眞珠誌)
* 양현석(梁玄錫) 남원 양씨의 후손으로 동해 비천리에 살았다. 그는 천성이 효성스러워 맛있는 음식을 품속에 간직했다가 부모님께 드렸다. 부친이 병으로 눕자 산돼지 피가 좋다고 해서 산에 가서 잡아서 약을 써서 효험을 보았다. 부친상을 당했으나 노모 때문에 시묘살이를 하지 못하고 조석으로 성묘하며 몹시 애절하게 여겼다. 모친상을 당해서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삼년상을 치르니 유림에서 포상이 내렸고 효자각과 비를 세웠는데 판서 이재현(李載現)이 기문을 지었다.(眞珠誌)
* 엄충정(嚴忠貞) 효도와 우애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예법을 다해 부모를 모셨다.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으며, 특별히 참봉(參奉)을 증직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오영식(吳永植) 1940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나왔다. 묵호로타리클럽 회장, 동해상공회의소 부회장, 선창목재, 라자가구 리바트가구 대표이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왕순식(王順式) 이 고을의 장군(將軍)으로 있을 때에 고려 태조(太祖)가 신검(神劍)을 토벌했다. 왕순식은 명주(溟州)로부터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투를 벌여서 격파했다. 태조가 왕순식에게 말하기를, “내 꿈에 신통한 승려가 갑옷 입은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았는데, 이튿날 그대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도왔으니 이것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니, 왕순식이 아뢰기를, “제가 명주에서 출발하여 대현(大峴)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절이 있으므로 제사를 지내며 기도했습니다. 임금께서 꿈꾸신 것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했다. 태조가 신기하게 여겼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왕백(王伯) 본래 성은 김(金)으로 신라 무열왕(武烈王)의 후손이다. 충렬왕(忠烈王) 때 과거에 합격해, 규정(糾正)을 거쳐 우사보(右司補)로 자리를 옮겼다. 임금에게 총애 받던 사람의 첩장인의 임명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곤장을 맞고 귀양 가게 되었다. 충혜왕(忠惠王) 때,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전주(全州)로 돌아갔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원봉필(元奉必) 1937년 동해 출신으로 성균관대 약학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그는 국립보건원 위생공학연구담당관을 시작으로 여러 담당 과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생약생물학적제제안전평가부장 등을 지냈다. 의료연구 협동조합전무이다. 보건사회부장관표창,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원경출(元景出) 1934년 동해에서 출생하였으며 단국대 법률학과를 나왔다. 그는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 지부장, 국제로타리 3739지구총재 등을 지냈으며 프로스펙스 동해대리점대표이다.(강원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강원일보사,2006)
* 유창(劉敞)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에 책봉되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윤춘민(尹春民) 파형 윤씨의 후손으로 경북 영주에서 동해 삼화리로 이주하였다.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 은산(隱山) 그는 사노(私奴)였는데, 나이 겨우 13세 때에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 제 어머니를 따라 남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어머니를 업어다가 나무 아래에 모셔두었다. 제 점심밥을 어머니에게 먹이고는 김매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혹 제 밥을 나누어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내 밥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남의 밥을 먹으면 안됩니다.” 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내어 바치니 살아날 수 있었다. 비석을 세워 그 효성을 표창했다.(두타산의 역사-문헌자료편(김우철))
2012.12.02.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adfa43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