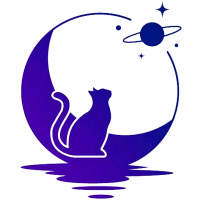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입니다
쟁기에 대해
쟁기에 대한 유래
쟁기’라는 말은 쇠로 만든 연장이나 무기를 뜻하는 ‘잠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후 ‘잠개’는 점차 ‘잠기’로 변화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장기’로 바뀌며 그 의미도 농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장기’가 ‘쟁기’로 바뀌기 시작해, 이것이 표준어로 굳어졌습니다.
사용 용도
논과 밭을 가는 데 쓰이는 농기구의 종류. 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우마(牛馬) 또는 기계력(機械力)을 이용하여 흙을 파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쟁기의 구성과 편리성
쟁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습인데, 철제가 나오기 전에는 나무를 깎거나 돌을 갈아서 썼으며, 가장 오래된 돌보습은 BC 3000년대 전반기 유적지인 황해북도 지탑리(智塔里)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형태는 대체로 긴 타원형으로 한쪽 끝은 좁고 반대쪽은 넓은 형태인데, 좁은 날 부분에 긁힌 흔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시작되는 자루목에 줄을 걸고 가래처럼 끌어 당겨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쟁기의 몸체는 참나무·소나무 등으로 만들며, 술은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를 씁니다. 쟁기는 술·성애·한마루를 세모꼴로 맞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다 한마루에 의지하여 볏을 덧댐니다. 한마루 끝이 보습까지 내려오므로 땅을 갈 때 보습과 볏이 힘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쟁기의 종류
①무상리-쟁기의 바닥이 전혀 없거나 아주 짧은 것으로서 흙과 마찰이 적고 심경(深耕)에 적합하지만 반전(反轉)이 좋지 않고 안전성이 없어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②장상리-쟁기의 바닥이 길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고 사용하기 쉽지만 견인저항(牽引抵抗)이 크며 심경에는 부적당합니다.
③단상리- 무상리와 장상리의 장점을 절충한 개량 쟁기로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쟁기는 거의 단상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성도 좋고 저항이 작고 역토의 반전·파쇄능력도 큽니다. 특히, 논의 경기작업에 적합하며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한국의 전통 쟁기는 크게 호리쟁기와 겨리쟁기로 나뉘는데,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을 호리쟁기라 하며, 두 마리 이상의 소가 끄는 것을 겨리쟁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의 형태에 따라 눕쟁기, 선쟁기, 굽쟁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2010.06.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